소련군의 유산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이들로서는 불운하게도, 러시아는 아직 한참 고난의 세월을 더 보내야만 했다. 그중에서도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전개된 제1차 체첸 전쟁은 러시아가 어디까지 나락으로 갈 수 있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전시장이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해체와 맞물려 일어난 체첸의 독립 선언을 옐친 정부로서는 용납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러시아군이 체첸 반군을 진압하고자 급파되었다. 러시아군 상부를 포함하여 누구나 러시아군의 손 쉬운 승리를 예상했다. 아무리 소련 해체로 혼란이 극도에 달한 상태라지만, 직전까지 미군과도 경쟁하던 러시아군이 체첸의 작은 지방 반란 정도는 너끈히 제압하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체첸도 2차대전을 겪고 3차대전을 대비했던 군사 동원 국가인 소련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체첸 반군 다수는 전직 소련군 장군 출신인 조하르 두다예프부터 말단 병력까지 소련군 복무 경력이 있었고, 소련제 무기의 운용법과 약점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체첸이라는 자신의 고향에 기반을 둔 무장 세력이었다. 당연히 현지의 언어, 문화, 정치적 상황 등 정보 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채 러시아 진압군에 게릴라전을 강제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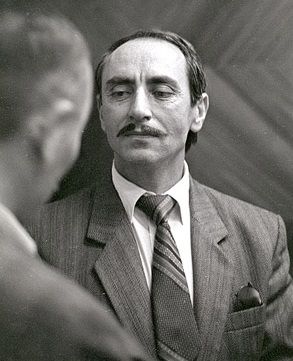
1994년 12월 31일, 이런 상황은 꿈도 꾸지 못한 채 러시아군은 전차, 포병, 공군을 통한 대규모 작전과 전면전에서의 우위를 믿고 주요 병력을 체첸의 수도 그로즈니로 진격시켰다. 러시아군은 간신히 그로즈니를 점령할 수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참패를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징집병들은 영문도 모른채 체첸까지 끌려와 제대로 된 지휘도 받지 못하고 시가전에서 급습을 당해 죽어나갔고, 제대 간 통신망은 엉망이어서 고립된 전차 병력이 체첸군의 RPG에 맞고 무수히 터져나갔다. 러시아군에 막대한 손실을 강요한 체첸군은 유유히 도시를 빠져나가 폐허가 된 그로즈니를 넘겨주고 산악에서 항전을 지속했는데, 여전히 유럽 평야에서 나토를 싸우는 것만 훈련을 받았던 절대 다수의 러시아군은 바로 직전 아프가니스탄의 경험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체첸군과 끝나지 않는 술래잡기를 벌였다. 소련이 해체되고 군이 대혼란을 경험하는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훈이 면밀히 분석되어 체계적으로 교리에 적용될 여유는 없었다. 결국에 전혀 훈련과 조율 없이 벌어진 게릴라 소탕전에서 러시아군이 벌인 민간인 학살을 비롯한 잔학 행위는 러시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규탄을 불러왔다. 최종적으로 체첸 게릴라가 산악에서 튀어나와 그로즈니의 러시아 점령군을 포위하면서 러시아군은 실질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옐친은 체첸에 굴욕적으로 자치권을 넘겨주는 협정에 서명해야만 했다. 이로써 체첸은 러시아 권력의 묘비로 우뚝 서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