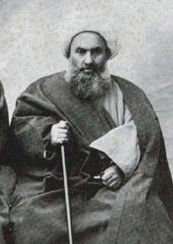사파비 제국이 멸망한 뒤, 이란은 1780년대 카자르 왕조가 다시 이란을 통일하기까지 혼란기를 거쳤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권력이 약화되고, 국가 이외 세력의 자율성과 힘이 커진 데 있었다. 사파비 황제는 튀르크와 루르, 쿠르드 등의 유목 부족들을 거느리고, 시아파 성직자들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했다. 황제에 의해 직접 통솔되는 굴람(노예병) 부대는 최고의 엘리트들로서 제국 질서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사파비 제국이 사라지면서 이 모든 질서가 무너졌다. 유목 부족장들은 자신들의 영역에 따라 이란 영토를 분할했고, 농민들로부터 자체적으로 세금을 징수해갔다.

국법을 강제할 통일 권력이 사라지니 도시 지역에서는 성직자들의 자율성도 크게 증대되었다. 이란의 도시에는 훗날 울라마(성직자)-바자리(시장 상인) 동맹으로 알려질 사회적 연합체가 등장하고 있었다. 도시의 소규모 장인과 유통 업자들은 바자르에 모였다. 바자르 인근의 모스크와 마드라사에는 시아파 신학을 평생 공부한 신학자들이 있었다. 바자르 상인들은 그들의 부를 통해 성직자에게 기부를 하고, 시장 내외의 다양한 송사를 맡겼다. 상인과 신학자는 같은 가문에서 동시에 배출되는 경우도 많았고, 거미줄처럼 얽힌 통혼 관계를 통해서 더욱 단단히 결속했다. 국가 권력이 부재한 가운데 시아파 성직자들은 국법보다 우선한 종교법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 이런 18세기 말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 우술리-아크바리 논쟁이었다. 아크바리 학파는 시아파 내에서도 개별 신도의 자율적인 샤리아(율법) 해석을 지지한 반면, 우술리 학파는 무즈타히드라 불리는 학식이 높은 성직자들의 모범이 일반 신도보다 우선함을 주장했다. 사회적 권위가 사라진 혼란의 시기에 일반 사람들은 우술리 학파의 권위 있는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의지하면서 풍파를 버텨야만 했다.